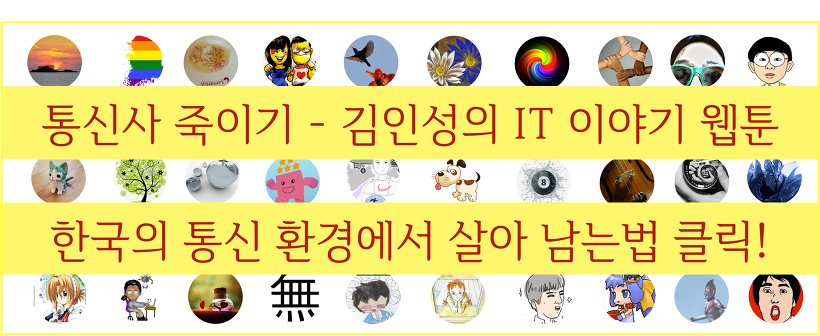미닉스의 작은 이야기들
이청준님을 보내며 본문
이청준님께서 가셨습니다.
그가 질투하던 백년 후의 세상을 저도 보지는 못하겠지만 그가 꼭 그 시간만큼을 아쉬워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라지는 순간부터 그 다음은 언제나 질투 나는 시간이겠지요. 장난스럽게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듣는 빠삐놈은 어제 죽은 그가 듣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악마의 음악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억압을 상징과 비유를 통해 젊은 우리를 각성시켰던 “당신들의 천국”도 있었지만 스스로 병원을 나섬으로써 세상에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퇴원”으로 시작하여 “매잡이”와 같은 소재에 집착하는 관념적인 글도 있었지요. 집요하게 파고드는 언어들이 지겨울 때도 있었으며 작은 계기로 전체 상황이 반전되어 버리는 특이한 전개가 이해하기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고 그것이 다시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도 복잡했지요. “잃어 버린 말을 찾아서”에서는 거짓된 말이 서로 은밀히 야합을 하고 교미를 하여 자기 확대되는 불신의 시대를 고발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편 “선학동 나그네”에서 보여지듯이 소리를 통한 구원을 통해서야 말을 되찾을 수 있음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두 가지 길이 합쳐지는 “다시 태어나는 말”은 삶이 말이 되고 말이 삶이 되는 세상, 거짓된 언어가 죽고 진실한 언어로 된 세상을 꿈꾸었지요. 불성무물일까요? 오늘 이 시대 그는 거짓의 언어들이 다시 판치는 현장 속에서 고통 받는 우리들이 그의 역할을 기대할 때, 한 선각으로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 주기를 원할 때 “기로수씨의 마지막 심술”처럼 우리의 바램을 저버리고 훌쩍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화밀교”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미 다 이야기 했습니다. 물론 우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기나긴 시간을 거치며 이미 우리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가 전해 주었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은 언제나 우리를 더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했었고 언어가 그 본질을 잃어 버릴 때 떨쳐 일어 나야 한다는 자각을 이미 우리 DNA 속에 심어 주었지요. 우리가 이루어 낸 민주주의라는 절차를 지키는 것보다 불의를 응징하는 것이 더 중요해 졌을 때, 더 이상 민주주의가 지켜질 전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저마다 횃불을 들고 산을 내려 갈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 백 년이 흐르고 나면 우리는 이제 아무도 여기에 남아 있지 않으리라는 것보다도 더 분명한 사실이 있으랴. 그때 우리는 이곳을 떠나가고 지금은 그 목소리나 생김새조차 상상할 수 없는 인간들이 이 곳을 드나드는 주인이 되어 있을 것을.
아니 도대체 그는 어떤 내력으로 그 곳에다 그런 독백을 남기고 싶어졌더란 말인가. 그의 생애에 대한 낭패감과 체념에서 헤어날 수 없는 어떤 절망감에서? 외로움에서? 그렇다면 그것은 그의 생애 가운데의 어느 대목쯤 되는 곳에서? 어느 해 어느 날쯤에? …… 그도저도 다 버린 채 이젠 이미 세상에서 사라져 간 세월 속의 허망스런 인간사가 되어 버린 것은 아닐는지……
나는 여인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든 이제 나의 가슴 속에서 어떤 암시인 양 안타깝게 피어 오르고 있는 말들을 무작정 혼자 지껄여 나가기 시작했다.
---- 백 년이 흐르고 나면 그는 이미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없으리라는 사실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없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나도 줄곧 그렇게 믿어 왔었구요. 하지만 난 오늘 저녁 아무래도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을 것만 같아요. 아니 그 말이 틀렸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틀렸다기보다 그냥 믿기가 싫어진 거지요. 적어도 그 말이 가르쳐 준 진실보다 더욱더 분명한 것이 있는 것만 같은데, 그게 무언지가 생각이 잘 나질 않는단 말입니다.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난 아까 거기서 댁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질 않았는데…… 그때까진 그런 대로 모든 게 정연한 편이었는데 말입니다.
---- 아니에요. 전 우습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저녁 선생님이 제 곁으로 다가오시고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어요. 믿었던 것이 믿을 수 없게 되고 지금까진 믿고 싶질 않았거나 믿으려조차 해 보지 않은 일들이 분명한 사실이 되어 나타나고…… 마치도 그 쓸쓸하고 암울스럽던 수많은 저녁들의 종소리가 갑자기 생기에 찬 찬송 소리로 돌변해 들려 오듯이……
나는 이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다방문을 나서고 보니 바깥은 언제부턴가 탐스러운 함박눈이 조용히 송이져 내리고 있었다. 아늑하고 정겨운 저녁 거리였다.
--낙서를 쓴 건 두 사람이었어. 흐르는 시간을 질투하는 사람들……
-- 그리고 그날도 아마 오늘처럼 포근한 저녁 눈이 내리고 있었을 거구요.
pp.273-283. 따뜻한 강, 이청준, 1986, 우석출판사.
님의 글은 저의 고통스러운 젊음의 시기에 구원이었으며, 현실의 추상으로써의 지적 자산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안녕히 가시기를, 그리고 조금은 행복해하셔도 허물이 되지는 않을 듯. 님은 갔어도 님은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오래도록 살아 계실 것이므로.
2008년 여름, 그대
없는 세상에서
'짧은 생각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LG 보고 있나? (83) | 2012.12.25 |
|---|---|
| 지난 한 해 돌아다닌 곳들 (6) | 2011.05.07 |
| 블로그 관리에 대한 반성 (16) | 2009.01.15 |
| ssd 이야기 6-2, 7, 8, 9, 10 예고 (3) | 2008.11.20 |
| ssd 이야기 6편 ssd와 서버 올릴 예정입니다. (2) | 2008.10.02 |
| SSD 이야기를 제본한 책이 나왔습니다. (7) | 2008.06.17 |
| 뽀빠이에게 거는 기대 (7) | 2007.08.25 |
| 예고: 심형래편 - 내 안의 사람들 (0) | 2007.08.17 |
| 토완섭격문 - 친일파 김완섭 비판 (9) | 2007.07.06 |
| 현진영편을 올리고 (2) | 2007.06.28 |